조선은 감염병과 어떻게 싸웠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참사다. 그러나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간 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역병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병 관련 기사는 수천 건에 이른다. “전쟁은 땅을 빼앗지만, 역병은 사람을 앗아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조선은 감염병의 공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과학이 아닌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조선의 방역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과도 묘한 울림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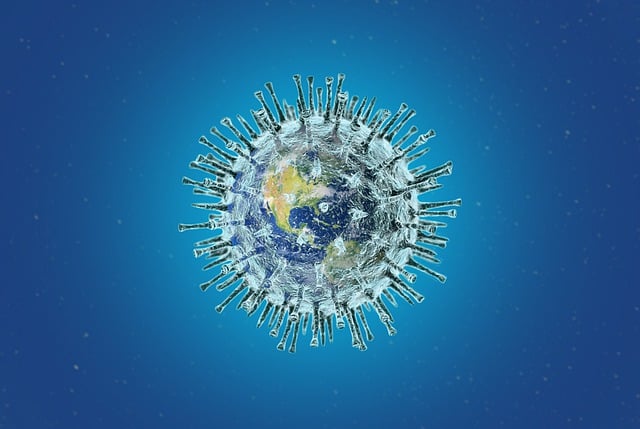
1. 실록 속 반복되는 단어: 疫(역)
조선왕조실록에서 '역(疫)'이라는 단어는 임진왜란보다 훨씬 자주 등장한다. 전염병은 대개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유사 질병이었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1494년, 성종 실록에는 "온 나라에 역질이 돌아 백성의 10에 4~5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역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국가 운영의 위기였다. 세금 징수가 멈췄고, 군사 동원이 불가능해졌으며, 상업과 교통이 마비되었다. 감염병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했다.
2. 방역의 시작은 ‘격리’였다
조선의 방역 방식은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이동 금지와 격리였다. 전염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역리(疫吏)’라는 감염병 담당 관리를 임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감염된 마을은 ‘폐쇄 마을’로 지정돼, 행정적으로 고립되었다.
왕실에서도 격리는 엄격했다. 정조는 역병이 돌던 해 친모의 병문안조차 포기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가(御駕) 이동 경로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에도 전염 경로에 대한 관념적 이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조선의 백신, ‘종두법’의 도입
천연두는 조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염병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시도로 18세기 후반 ‘종두법’이 도입된다. 지석영, 박제가 등 실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종두법을 적극 소개했으며, 순조대에 들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단위가 아니었다. 양반 자제와 일부 고위층 자녀 중심이었다. 민간에서는 미신이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부감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동양권에서 비교적 빠르게 예방접종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4. 민간의 대응: 굿, 약초, 기도
국가의 대응이 부족했던 시기, 민간에서는 각종 의례와 치료법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굿과 제사, 부적과 한약, 사찰 방문과 기도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산으로 올라가 ‘역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는 감염을 피하려는 자구책이자, 공동체의 심리적 위안이었다.
한편,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역병 치료와 예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조선 정부가 민간 의학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5. 국가의 위기관리 수단으로서의 역병
역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정치적 변수이기도 했다. 세자 책봉, 왕릉 조성, 외국 사신 접대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감염병은 때로 정적 제거나 정책 전환의 구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역병 탓에 불가피하다”는 말은 통치자의 만능 면죄부가 되었다.
특히 숙종·영조 시기에는 역병과 기근이 반복되며, 민심 이반과 농민 폭동이 함께 번졌다. 조선 후기의 사회 불안은 기후, 질병, 경제 위기가 맞물린 복합재난의 결과였다는 분석도 있다.
감염병은 언제나 시대의 민낯을 드러낸다
역병은 개인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균열과 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선의 방역 기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묻는다. 과연 우리는 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기록은 말한다. 전쟁은 끝날 날이 있지만, 역병은 사람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